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지 않기 시작한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카드를 써야지, 써야지, 조바심만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못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아예 안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를 보내지 않는 대신에 받을 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아직도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드는 받으면 반갑기보다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사인해서 보내오는 카드입니다. 더구나 사인조차도 인쇄해서 보내온 카드를 받으면 왜 카드를 보냈는지 의아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에 사인만 하고 가족에 관한 소식을 한 페이지 정도 복사해서 보내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아는 가정 같으면 모르는데, 잘 모르는 가정의 가족 얘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보내야지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카드를 받으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무감에서 보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보내주는 카드는 다릅니다. 몇 줄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적어서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카드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받고도 썩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비싼 과일 바구니나 선물 패키지를 택배 시켜오는 데 상대방의 기호를 전연 고려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먹지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처고모가 계신데 이분은 선물하는 데에 귀재이십니다. 상대방 기호에 딱 맞는 선물을 하는 은사를 가지셨습니다. 선일이와 선주가 자랄 때 그 나이에 딱 맞는 선물을 해서 기쁘게 만들곤 하셨습니다. 가슴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선물하기도 하고, 예쁘게 성명이 인쇄된 편지지와 봉투를 선물하기도 하셨습니다. 제 회갑 때에는 내가 태어난 1944년 10월 15일에 발간된 사진 잡지 “LIFE'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고서를 구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을까 싶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미국 사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매년 하듯이 부부끼리 선물하는 대신에 불우한 이웃에게 선물하고, 자녀들에게 줄 선물 일부는 불우 아동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받는 계절이 아니고 주는 계절로 만들 때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담임목사(as a senior pastor)
“진정한 크리스마스 축하” <12.11.2005>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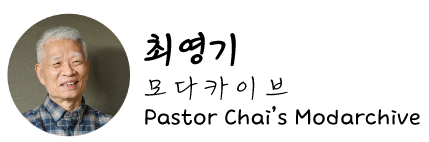

 손님
손님